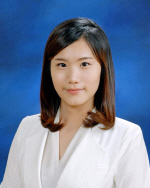|
눈 여겨볼 부분은 AI 플랫폼을 수출한 곳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인 현대카드라는 점입니다. 금융사와 빅테크 간에 차별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최근 전통 금융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놓여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간편결제,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업에 뛰어들면서죠. 반면 금융사들은 플랫폼 사업 진출에 제한이 있는 등 차별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회사 소유 규제입니다.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사는 비금융사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할 수 없습니다. 업종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 진출이 가능해진 것과는 상반된 상황입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전통적 금융업에 기반하고, 자산 규모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플랫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3개사는 모두 빠져있어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자는 현행법상 금융사로 인정하지 않고, 제공 서비스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상도 아닙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5~1.5% 수준인 반면 네이버페이는 0.83~2.19%, 카카오페이는 0.89~1.79%, 토스페이는 1.6~3% 수준입니다. 카드사는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규제를 받아 매년 인하 압박을 받아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빅테크와 전통 금융사에 대한 규제 차별이 여전한 가운데, 빅테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당초 빅테크들에 기대했던 역할은 혁신적인 서비스로 경쟁을 유도하는 메기입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데다,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 간편결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하기보다는 끼워팔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카드가 2015년 '디지털 현대카드'를 선언한 후 꾸준한 투자를 해온 결과 빅테크도 하지 못했던 플랫폼 수출을 이뤄낸 것으로 보입니다. 쉽지 않은 환경에서 금융권 최초로 독자 개발 플랫폼을 수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가 폭 넓게 인정돼야 정부의 규제 일변도에도 변화가 일 수 있고, 결국 다양한 혁신에 대한 시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