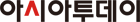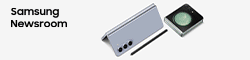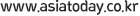|
아마도 지난 100년 아르헨티나만큼 극적으로 내려앉은 나라는 세계에 없을 것이다. 20세기 초에는, 그 주민의 평균 1인당 소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했다. "아르헨티나 사람처럼 부유한(riche comme un argentin)"이라는 표현은 당시 흔했었다.
아르헨티나의 추락은 바로 이 이름,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on) 대령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1945년 2월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의 첫 임기는 1955년까지 계속되었다. 그의 정치적 의제인 '큰 정부'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전화 회사가 국유화되었고, 그것의 철도 회사들, 그것의 에너지 공급, 그것의 민영 라디오가 국유화되었다. 1946년과 1949년 기간에만 정부 지출이 세 배로 되었다. 공공 부문 고용인들의 수는 1943년 24만3000명에서 1955년 54만명으로 증가했다―많은 새 일자리가 페론의 노동자당의 지지자들을 부양하기 위해 정부 기관들에서와 공무원에서 창출되었다. 경제 정책은 사회주의적이었다. 철도 승객수와 화물량이 침체했는데도 철도 고용인들의 수는 1945년과 1955년 사이 오히려 5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 페론주의 노동조합들은 아르헨티나에서 군대와 나란히 가장 강력한 조직들이 되었다. 페론의 아내 에바 두아르테스(Eva Duartes)는 여자 주인공처럼 숭배되었고, 사회 복지에 돈을 척척 나누어 주었다.
군사 독재 정부들과 페론주의 정부들이 서로를 대체했다. 아르헨티나는 더욱더 빚에 빠졌다. 1973년에, 페론은 세 번째 집권하였다. 그리고 다시 그의 정책 목표는 '재분배'와 '강력한 국가 규제'였다.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는 군부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이들은 야당의 모든 당원을 난폭하게 박해했다.
경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역사는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국가 파산 그리고 빈곤화의 역사였다. 1816년 독립 이래, 그 나라는 아홉 번의 국가 파산을 경험했는데, 가장 최근의 것은 2020년에 있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던 아주 자부심이 강한 나라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다.
그래도 좋은 뉴스는 있다. 그 뉴스란 바로 더욱더 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과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이 더 많은 자본주의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하비에르 밀레이를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 "국가는 해결책이 아니다. 국가는 문제 그 자체이다."
국가 쇠퇴의 또 하나의 애처로운 예는 베네수엘라다. 20세기 초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였지만, 1960년대 말까지는 베네수엘라는 놀랄 만한 발전을 경험했었다. 20세기 중, 베네수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1970년대에, 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고, 스페인, 그리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높은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의 1인당 GDP보다 그저 13퍼센트 더 낮았을 뿐이었다.
경제적 운명의 역전은 1970년대에 시작됐다. 그 나라 문제들의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 대한 의존이었다. 그렇지만, 노동 시장에 대한 대단히 높은 수준의 정부 규제를 포함한, 다른 원인들도 있었다. 그 규제들은 1974년부터 연이어 물결을 이룬 새 규제들로 강화되었다. 라틴아메리카 거의 어떤 다른 나라에서도 (혹은 그 문제와 관련 세계에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노동 시장이 그렇게 심하게 규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베네수엘라의 예가 보여주듯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커질 때,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배울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는 보장된 행복한 결말을 가진 할리우드 영화와 같지 않다. 혹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정은 항상 더 나빠질 수 있다.
많은 베네수엘라인은 자기들의 나라를 부패, 가난 그리고 경제적 쇠퇴에서 구해낼 구세주로서 카리스마 있는 사회주의 지도자 우고 차베스(Hugo Chavez)를 믿었다. 차베스는 1998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많은 베네수엘라 빈민에게 희망의 등대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류의 "21세기를 위한 사회주의(Socialism for the 21st Century)"에 관한 그의 연설은 유럽과 북아메리카 좌파 구성원들 사이에 이상향과 같은 낙원의 꿈들을 되살리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잘 안다. 베네수엘라는 처음에는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그다음에는 정치적 자유를 잃었으며, 오늘날까지 750만 사람(인구 4분의 1)이 그 사회주의 나라를 도망쳤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같은 한때 부유했던 나라들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곳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님은 물론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
많이 본 뉴스
연예가 핫 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 “문 닫았다간 낙인 찍힐라”…동네병원, 집단휴진 참여 저조
- ‘알짜 상임위’ 독식해놓고…‘11대 7’ 民心이라는 국회의장
- 박세리 “부친 채무문제 반복…더이상은 책임지지 않겠다”
- 시스템 조기 분리·위탁 종료…라인야후 ‘脫네이버’ 가속도
- “K뷰티 세계화 절호의 기회…발전 가로막는 규제 없애야”
- “소속사 대표에 둔기로 맞았다”…현직 아이돌 경찰 신고
- 두 집 중 한 집은 ‘맞벌이’…처음으로 600만 가구 넘었다
- 55년간 ‘최초·최고·최대’ 타이틀…가전·모바일혁신 이끌다
- “숨만 쉬어도 텅장” 韓생활물가, OECD 평균대비 60% 높아
- ‘최대 200㎜’ 내일 제주서 장마 시작…중부지방은 무더위